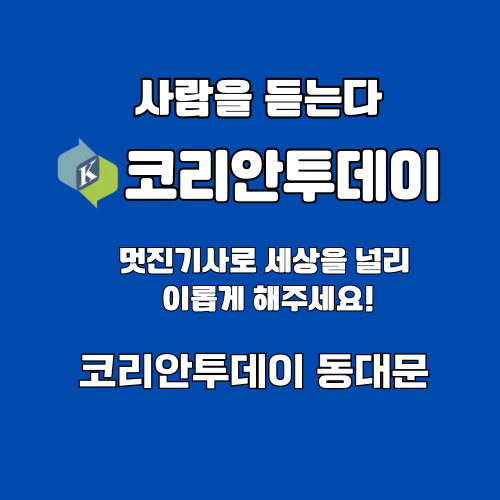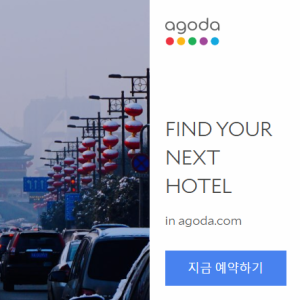가난했던 시절 온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누님.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다 내어주고도 끝내는 수술비가 미안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누님의 이야기.
희생 앞에서 무너지는 이기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생을 지킨 누님의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코리안투데이] 머릿돌64. 사랑으로 사라진 한 생애, 우리에게 남긴 깊은 질문 © 지승주 기자 |
가난한 집의 장녀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야 했던 누님이 있었다.
갓 손에 물이 마를 나이에도 자기 꾸밀 시간 한 번 없이
번 돈을 모조리 고향집에 보내며
동생들의 앞날을 위해 주저앉지 않고 견뎌냈던 사람.
봉제공장의 먼지를 뒤집어쓰며 밤낮없이 일했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동생들이라도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며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냈다.
사랑했던 남자와의 인연도
“내가 이 집안의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눈물로 보냈고,
그렇게 누님의 젊음은 희생으로만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해 약으로 버티다가 결국 쓰러졌고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위암 말기.
다행히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말에
누님은 떠오르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건다.
“동생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더라.”
하지만 미국에 사는 큰동생은 골프를 치다 말고
“누나, 내가 그 돈이 어딨어?”
하며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는다.
둘째 동생 역시 변호사였지만
“요즘 수입이 없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막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막일하며 근근이 살던 막내 부부는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누나, 집 보증금 빼왔어. 이걸로 수술합시다.”
누나는 그 말에 울음을 삼키며
그동안 자신의 희생보다
막내의 어려운 형편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보호자로 함께 지켜보던 올케가 잠든 사이
누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찬바람 속 횡단보도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불빛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누나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막내야, 올케야… 고맙다.
내가 마지막이라도 보험을 들어놔서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나 누님의 사망보험금이 크다는 소식을 들은 두 형들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막내 부부를 협박하며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막내는 누나의 뜻을 지키고자
모든 두려움에도 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가 누나의 휴대폰 속 마지막 메시지를 읽자,
두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삶은 참 그렇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고,
희생 앞에서는 누가 진짜 가족인지도 드러난다.
그 누님은 성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자신의 삶은 한없이 비우고,
동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결국엔 막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랑을 남겼다.
우리가 누나·형·부모님·그 시절의 어른들을
함부로 ‘꼰대’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한국 사회의 밑거름이 되어준 세대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극도의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우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