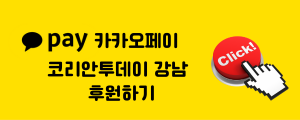어둠 속에서 여섯 개의 얼굴이 관객을 똑바로 응시한다. 포스터 속 인물들은 웃고, 분노하고, 침묵한다. 그 표정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단어 하나. D-DAY. 결단의 날, 혹은 파국의 날. 이 연극의 제목은 이미 우리 사회의 시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았는가” © 김현수 기자 |
나는 이 포스터를 처음 보았을 때, 작품의 줄거리보다 먼저 ‘우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살톡방, 죽음을 전제로 모인 사람들. 자극적인 설정이지만 낯설지 않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뉴스에서, 댓글에서, 그리고 무심한 일상 대화 속에서 비슷한 단어들을 스쳐 지나왔다. 연극은 그 익숙함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작품이 불편한 이유는 죽음을 다뤄서가 아니다. 오히려 불편한 지점은 그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를 묻는 방식에 있다. 각자의 사연은 특별하지 않다. 학교, 가족, 돈, 관계. 너무 평범해서, 누구라도 한 발짝만 더 미끄러지면 도달할 수 있는 자리다. 연극은 관객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 안전한가라고.
무대 위 인물들은 서로를 구원하지도, 완전히 파괴하지도 않는다. 대신 끝없이 흔들린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요즘 사회가 가진 기묘한 모순을 본다. 우리는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정작 살아갈 이유와 조건에는 무심하다. 위로는 넘치지만, 책임은 희미하다. 연극은 그 공백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파고든다.
공연 제목 아래 적힌 부제, Death Difficult Decide. 죽음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 문장은 역설처럼 읽힌다. 그렇다. 죽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이 연극은 죽음을 권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 순간까지 몰린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밀어냈는지를 보여준다. 무대 위 인물들이 점점 관객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질문은 명확해진다. 이 결정은 정말 개인의 것인가.
연극이 끝난 뒤에도 포스터 속 얼굴들이 쉽게 잊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연기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D-DAY’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연극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침묵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대사일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관객의 자리로 돌아온다. 무대를 떠난 질문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