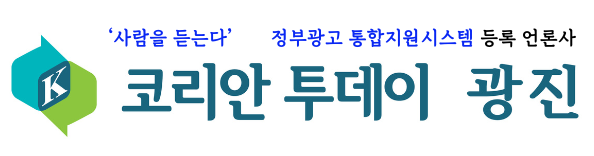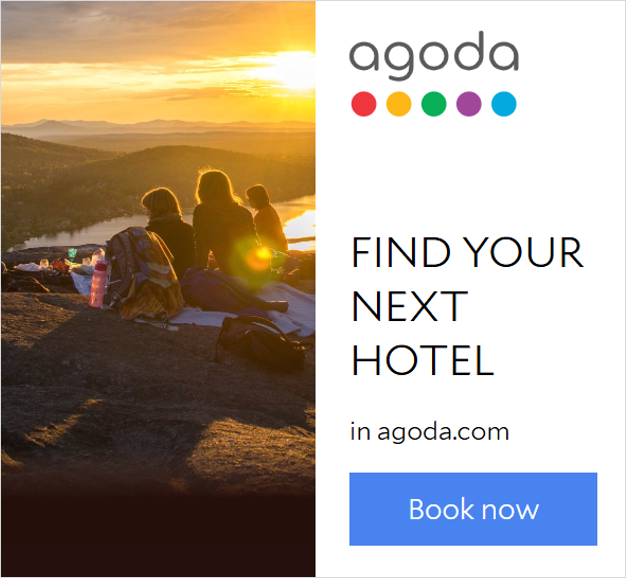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현실성과 풍자를 앞세워 인기를 얻고 있지만, KT에서 구조조정을 겪은 이들에게 이 드라마는 웃으며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의 좌천과 퇴출 압박 과정은 KT 현장 직원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KT는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5,700명을 재편 대상에 올렸고, 이후 6명의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치거나 돌연사했다.
 [코리안투데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스킬것 모습 © JTBC 제공 |
드라마 속 주인공 김 부장이 본사 영업직에서 지방 공장의 안전관리팀장으로 밀려나는 장면은, 실제 KT 직원 A씨가 경험한 현실이었다. 오랜 기간 재무 업무를 해왔던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통신망 유지·보수 현장으로 내려갔다. 전신주에 오르고, 맨홀에 들어가는 일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KT 정식 직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버텼다.
문제는 회사가 이 업무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KT는 지난해 ‘AICT 기업 전환’을 선언하며 선로 유지·관리 인력을 통으로 자회사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4,40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이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희망퇴직, 임금 70% 수준의 자회사 전환, 또는 영업 직군으로의 강제 배치였다.
설명회에서 간부들이 사용한 표현은 압박에 가까웠다.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 “외곽 발령 가능성이 높다”, “남아봤자 고과는 계속 낮을 것” 등 사실상 잔류 포기를 유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KT에 남기를 선택했다. 자회사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급격한 임금 감소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퇴출 압박은 구성원들의 삶을 흔들었다. 지방에서 케이블 매니저(CM)로 일하던 C씨는 구조조정 발표 이후 표정이 달라졌다고 주변 동료들은 기억한다. “버려진 카드가 됐다”는 말을 반복했고, 늘 깔끔하던 사람이 같은 옷만 입고, 밤마다 술에 의존했다. 결국 그는 직무 전환 교육을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KT에 입사했을 때 고시 합격 같은 기쁨이 있었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절절한 문장이 남았다.
구조조정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직 ‘토탈영업TF’는 2,600명의 잔류 인력을 영업직으로 배치했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영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CM로 일했던 D씨는 “기술직 중심의 인력을 갑자기 영업 조직으로 몰아넣고 실적을 기대하는 건 방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존 대리점과 업무가 중복되면서 매출 구조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과거 KT는 2009년 3,500명, 2014년 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민영화 이후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반복된 정리 압박은 현장 직원들에게 ‘언제든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각인시켜 왔다.
입사 15년 차인 E씨는 지난해 생애 처음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그는 “선배들이 섬 발령을 받는 걸 봤고, 50대 여성 안내원이 전신주에 올라가는 것도 봤다”며 드라마 장면들이 실제 기억과 겹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이 드라마를 편하게 볼 KT 직원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E씨가 근무하는 전화국 건물은 과거 200명이 일하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들만 오갈 뿐, KT 직원은 그와 몇 명의 TF 인력뿐이다. 그는 “역사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며 “우리가 끝나면 이 건물 전체에서 KT 직원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남은 직원들에게 KT는 더 이상 안정적인 ‘기간통신기업’이 아니다. 반복된 구조조정 속에서 직원들은 조직의 미래보다 자신의 내일을 먼저 걱정하게 됐고, 이는 드라마보다 더 냉혹한 현실로 남아 있다.
[ 임희석 기자: gwanak@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