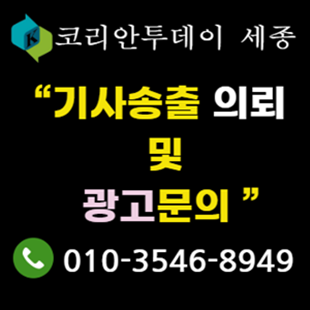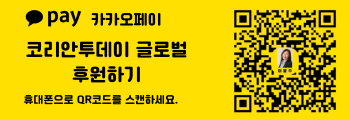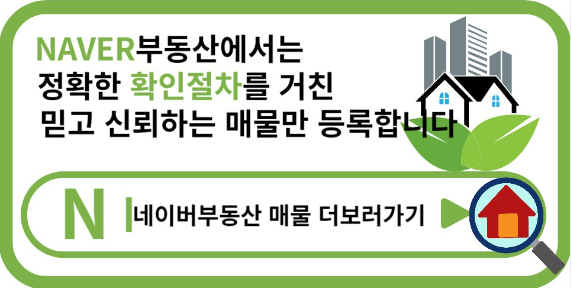조선 초기 태종 때의 명재상 유관 선생은 청렴과 근면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평생 검소한 생활을 고수하며 이웃을 돕고 농사를 지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
[코리안투데이] 검소하고 근면한 유관선생 이미지(이미지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유관은 흥인지문(현재의 동대문) 밖에 안방과 사랑채가 나란히 붙어있는 초가집에 살았다.
『동국여지비고』라는 역사책을 보면 공의 직급이 차츰 높아져 정승 반열에 올라 궁색을 면할 정도로 국록(요즈음 말로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았음에도 그가 하도 청빈하게 살다 보니 집에 바깥 대문과 담이 없었다 한다.
관직에 있는 다른 이들이 공에게
“영감께서 이제는 정승 반열에 오르시어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 집을 옮기시거나 수리를 좀 해서 쓰는 것이 좋을 듯 하오이다.”
하며 넌지시 말을 건네면
“아직도 집이 쓸만하고 손때 묻은 것들이 많다 보니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하며 회피를 했지만, 공께서는 어렵게 사는 이웃이나 친척들을 돕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다.
태종 임금께서 정승인 유관이 초가집에 대문도 담도 없이 청빈하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공이 잠든 밤을 이용하여 몰래 선공감을 보내어 울타리를 쳐 주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께서는 한겨울에도 거의 맨발로 사셨다.
그 당시에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무명솜을 다진 버선을 양말처럼 신었었는데, 공께서는 버선을 아껴 신느라고 집안에 들어오면 여름이나 겨울에도 항상 맨발로 지냈다.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찾아오면 먹던 밥알을 삼키는 대신 숟가락에 밥알을 뱉어놓고 맨발에 짚신을 신고서 마당으로 나섰다.
찾아간 사람이 송구스러워서
“아니, 정승 어른께서 이러시면 저희는 어쩌란 말입니까? 면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좀 보게나. 자네들은 사람인 나를 보러 오는 것이지 벼슬 사는 나를 보러 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집에는 오지 말았어야지.”
 [코리안투데이] ‘서울시 하정 청백리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청백리 명예의 벽’ 모습(사진제공: 구르미) ⓒ 박찬두 기자 |
평소에 그저 공정무사하고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찾아가기는 했지만, 첫 말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낯으로 사사로운 부탁을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공께서는 무척 부지런한 분이셨다 한다. 집 앞에서 손수 밭을 일구시어 거름을 갖다주고 채소나 푸성귀를 심어 반찬으로 썼다.
한번은 여름에 누가 공을 찾아갔더니 반색을 하면서
“자네 마침 때맞춰서 잘 왔네.”
“……”
“지금 밭에 잡초가 너무 성해서 내가 김을 매러 나가는 길인데 혼자 갈려니 너무 심심해서 누구 동무해서 갈 사람이 없나 생각 중이었어.”
“하지만 전……”
“상관없어. 자네랑 나랑 같이 김을 매면서 찾아온 용건을 얘기하면 되지 않은가? 더운데 방안에 틀어박혀서 부채질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맑은 바람 쐬면서 김을 매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인간적인가. 그렇게 하세나.”
“저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밭일을 한번도…….”
 [코리안투데이]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하정 유관 선생의 모습(그림제공: 김숙분 글, 정림 그림, ‘가문비어린이’, 소년한국일보) ⓒ 박찬두 기자 |
“아니! 뭐라고 일을 하기 싫다고? 그럼 삼시 세 때를 먹지를 말든지 해야지. 자네가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무릇 정치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여러 가지 한몫 겸해서 해야지. 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정도 들고 또 일을 다하고 나서 등목도 함께 한다면…….”
그렇게까지 나오는 데야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선비요 관리라 생각했던 젊은 선비라 할지라도 꼼짝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꿈지럭거릴 수 있다면 일을 해야지. 일 중에는 천하지대본 (天下之大本)이라고 할 농사가 제일이지. 안 그런가? 농부의 마음, 곧 농심(農心)이면 무불성사(無不成事)라. 안 되는 일이 없어. 정직하고 근면한 마음이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뭇 백성을 먹고 살게 하고…….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은 정승이나 농부나 같지. 아니 농부 중에 제일로 치는 농부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야. 자식 농사를 지으니까 말이야.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이라는 결실을 후에 거두니까 말이야!”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었고 또 교육관이었다.
유관 선생의 삶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검소함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통해 백성의 삶을 이해하려 했으며, 교육의 가치를 중시했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됩니다.
특히 “사람인 나를 보러 오는 것이지 벼슬 사는 나를 보러 왔단 말인가?”라는 그의 말씀은, 지위나 권력보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했던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청렴과 근면, 그리고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 일관된 유관 선생의 삶은, 물질만능주의와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