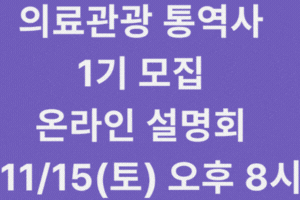정년과 연금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재고용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적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이다. 정년연장이 법제화되기 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택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고용이 확대될수록,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정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재고용 근로자가 겪는 공백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보호의 부재’로 이어진다.
정년을 앞두고 암이나 중증 질환 진단을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 시점이 기존 근로계약 종료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정규직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병가, 유급휴직, 단체보험, 의료비 지원 등 회사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년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코리안투데이] 폐암 진단을 받고 35년 머물렀던 직장을 떠나는 모습 © 임희석 기자 |
재고용은 새로운 계약이다.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치료가 끝난 뒤에야 재고용 절차가 다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직원이 아닌 상태로 치료 기간을 보내게 되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치료 이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재고용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치료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은 새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치료로 인해 발생한 공백은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계약 기간의 계산 방식이다. 재고용은 통상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치료로 인해 몇 개월을 쉬었더라도, 이후에는 동일한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질병을 겪은 근로자는 더 불안정한 조건에서 더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재고용이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재고용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돌발 변수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정규직 고용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보호 장치는 계약직 재고용 단계에서 대부분 사라진다.
재고용이 소득 공백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의 공백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단절, 의료비 부담, 고용 불안은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고용과 복지의 연계로 풀고 있다. 일본은 재고용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근로자 보호를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독일은 장기 근속자의 질병 위험을 고려해 단계적 은퇴와 사회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재고용을 단절이 아닌 연속의 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재고용은 여전히 기업별 합의에 의존한다.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예외 상황에 대한 공통 기준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재고용은 ‘일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재고용이, 또 다른 불안을 낳고 있다면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재고용이 단순히 근무 기간을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정년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제도로 기능하려면 근로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재고용은 해답일 수 있다. 하지만 보호 없는 재고용은 또 다른 공백을 만든다.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재고용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 임희석 기자: gwanak@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